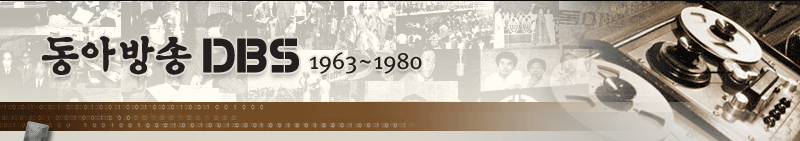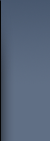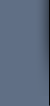|
(음악)
삼일제약 제공. 두꺼비의 일요방문.
(음악)
(광고)
(음악)
(문 여닫는 소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서울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 반달, 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를 작사 작곡해주신 윤극영 선생님 댁에 지금 제가 와 앉아 있습니다.
윤 선생님, 여기 오신 지 아마 몇 해...
- 한 5년 되죠.
- 여길 서부 개척하는...
- 뭐, 개척이라고 하면 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고독하더라도 독경을 좀 번화하게 가져볼까 하고 말이지.
- 바로 서쪽이 백운대가 되겠죠? 선생님.
- 그렇습니다. 인수봉하고.
- 네네. 이, 또, 이, 뒤쪽이 삼각산.
- 삼각산.
- 네네. 마치 뒤쪽을 이렇게 참 바라다보니까 스위스 어떤 한구석에 와있는 그런 기분이 납니다.
- 그 이상이죠. 허허허허허.
- 이, 저, 이...
(창문 여는 소리)
- 문을 좀, 창문을 열어놓고 좀 인터뷰를 해야겠습니다.
- 아, 그럽시다.
- 요 앞에 연못이 굉장히 넓습니다요.
- 근데 이게 에... 50평 정도나 55평 정도 될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 풀을 만든다고 말이야.
약간 건방지게-. 이히히히히히.
- 형태도 좀 풀 형태로 돼있구만요.
- 어, 풀 형태고-.
- 네.
- 그리고 시집오기 전에 말이지. 예, 시집오기 전에 누구냐 하고 물으면 내 맏며느리 목욕탕이라고 그랬지.
- 네에, 네네.
(사람들의 웃음소리)
-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조성을 했어요.
- 네, 며느님을 위해서 아주 선생님은 더욱이-
- 예, 어째 나는 맨 장작개비 같은 아들 삼형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없지.
- 아... 네.
- 쟤가 장작이야. 아주 똑똑하고 말이지. 거 연하고 부드럽고, 시아비 뒤를 좀 봐줄 사람.
내 뒤를 치러줄 사람이 누굴까 싶은데 며느리밖에 더 있어요? 아하하하하...
그러니까 아주 애지중지지. 아하하하하하.
- 그러니깐 지금은 뭐 고기를 넣으셨...나요?
- 연못에?
- 네네.
- 예, 지금 뭐, 고기래야 그 전엔 잉어를 조금 가지고 있었었는데.
- 네.
- 궁한 바람에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그러고 지금은 잡어. 그 중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
- 네네.
- 뭔고 하니 인제 금붕어도 집어넣고 금잉어도 집어놓고 먹잉어도 집어넣고 먹붕어도 들어갔거든.
- 네.
그리고 방치해버렸단 말이야.
- 네네.
- 그러니깐 거기서 튀기가 생기더군. 국제아가. 그래서 나는 그걸 우리 연못에 있는 국제아라도 그래요.
- 네네...
- 하하하,
- 네. 요기 지금 이게 몇 평...
- 이게 이천여 평 돼요.
- 이천여 평이요. 네, 저쪽 위에 보이는 것이 계사...
- 예예.
- 저게 계사...
- 저기 보통. 어... 여태까지 재래식 양계죠.
- 네.
-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경영했던 거죠.
- 네. 이 방은, 이건 이, 저... 윤 선생님이 혼자...?
- 그럼요, 서재죠.
- 서재로 쓰시고, 저 위채가 이제...
- 위채가 살림집이구요.
(아이 목소리)
- 네, 이, 저, 자동차에 내려서 첫발을 들여놓으니까는 이런 감이 납니다. 뭐 미국의 저, 이,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마치 이게 윤극영 랜드, 즉 윤극영의 무슨 어린이나라에 들어온 그런 감이 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 개집에도, 개집을 보니깐요. 보통 집에 있는 개집이 아니고 이렇게 저, 이, 나란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참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고 그림은 어떻게 선생님이 그림도 직접-.
- 여기 올라가면 개장이 있어요.
- 네네네네.
- 그거는 저, 돌아가신 윤백남 선생-.
- 네.
- 그분의 둘째 따님이 여기-.
- 아...
- 미술전공을 했었어요.
- 네.
- 그래서 인제 제 친구하고 같이 와서-.
- 네.
- 불란서의 어디 입선된 그림을 모방을 했대.
- 아, 네...
- 누군지 내 이름을 잊었습니다.
- 네.
- 그래서 3,4일 와설랑은 그림을 그려주고 갔어요.
- 네.
- 그리고 그곳을 지나니까 솔밭, 이 솔나무 사이에 벤치가 노랗고 또는 파란 벤치가 놓여 있고 아무튼 속세를 좀 떠나서
어디 집을 와 있는 그런-.
- 아니, 그런데 내가 반문하고 싶은데 말이야. 어느 틈에 남의 집을 돌아다녔어요? 응? 그건 경우가 좀 우습다.
- 아하하하하... 하지만 선생님 책상 위에는 오선지로 또, 뭐, 거의 원고지로 꽉 한 평 가량 되는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 그래, 그래요. 나는 인제 뭐지, 60이 넘지 않았습니까.
- 환갑이 선생님이?
- 작년이죠.
- 아, 작년이셨죠? 아, 네네네. 인제 기억이 납니다.
- 그래서 그래도 어디고 모르게 들먹거리는 게 있단 말이야.
- 네.
- 그냥은 못 있어요. 육제척인 면에 있어서는 허약해가지만 말이지. 정신연령까지는 뺏길 수는 없단 말이야.
- 아, 네.
- 그래놓으니까 하여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늘 공부한다. 네, 성실성을 갖춰서 일을 고양하는 데 충실해보겠다 이 말이지.
- 네.
- 그래서는 에, 한 50편 정도를 아, 5월 5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또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걸 내 한 권 드리죠.
- 아, 네. 이겁니까요?
- 네.
- 네... 여기 보니 뭐 할아버진 자꾸만 주무시나 봐. 옆에서 떠들어도 모르시나 봐. 엄마가 손을 대도 모르시나 봐.
저녁 해가 다...
- 마지막.
- 마지막 어...
- 서산 너머.
- 서산 너머 갑니다. 네... 이건 윤 선생님을 그리신 건 아닙니까.
- 예, 이거 내 손자를 생각했거든. 요걸 생각했거든.
- 네네네.
- 그래서 장차로 맡겨두면 이런 운명의 시련이 올 거란 말이야.
-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 그러면은 저 꼬마가 그 때 몇 살이 될 런지는 몰라도.
- 네.
- 그 시련을 접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지는 않는가 말이야.
- 네.
- 그러면 그 노래와 더불어 난 나를 거라 말이지. 아하하하하.
(아이 목소리)
- 곡조가 도미솔미미- 이게 F조죠?
- 네.
- 미파미레도도솔라 도시레 도솔, 이렇게 나오는군요.
- 근사하슈. 근데 나는 높은 음이래서 리라라라런더더, 주무시나 봐아~~ 옆에서 떠들어도 모르시나 봐~~아아~
엄마가 손을 대도 모르시나 봐~ 아아, 저녁 해가 마지막 서산 너머~ 갑니다~~~
- 아이구.
(사람들의 웃음소리)
- 네, 이건 정말, 어이, 손주 녀석이 박수를 칩니다.
- 아, 칠 테죠. 아하하하하하.
- 여기 참... 참...
- 아부리가 노래하셨대요.
- 누가 아부리?
- 할아버지를 아부리라고 그러잖아요.
- 아... 네.
- 리자를 그렇게 많이 붙여요.
- 리자를요? 네...
- 승우도 노래할 줄 아니? 책가방 하겠어?
(음성)
- 모자 합창단이라는 걸 하나 해가지고 직접 지휘도 해보고.
- 아...
- 대 사회적인 활동을 한번 전개해 볼려고 하는데요.
- 듣던 중 제일 반갑습니다.
- 젊은 양반들 생리에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모르죠.
-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 해보는 거지 뭐.
- 네... 이, 저, 며느님을 제일 아버님이 사랑하시는 모양인데, 아버님 되시는데 아버님은 어디,
일과를 대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보통.
- 아침에 이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시면요. 보통 기침하시면 독서도 하시고
글 쓰시는 것도, 작품도 쓰시고 이제 7시쯤 되면 사과즙 한 잔, 그게 아침식사에요.
- 아, 네네.
- 그렇게 드시면 집에서 그냥 나가셔서, 9시쯤 되면 보통 나가시죠.
- 네, 아... 그렇게 일찍 나가세요?
- 네.
- 그저 일찍 들어오시는 날은 6시 정도 되시구요. 보통 7시쯤 돼야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 아...
- 점심진지는 보통 밖에서 드시고 되시구요. 저녁진지를 집에 들어와서 잡수실 때도 있으시고 또 안 드시는 때도 있으시구요.
- 네.
- 그래서 그저 어떤 때는 저희가 그런 불평을 해요.
- 네.
- 아버지는 공연히 집에 있는 거보다 숙소쯤...
- 하숙.
- 네,
- 그저 그런 불평도 아버지께서 뭐 너그럽게 대해주시니까요. 그래도...
- 며느리라고.
- 네. 아하하하하.
- 선생님이 아마 소파상... 1회 소파상을...?
- 네, 첫 번 소파상을 내가 탔죠.
- 네. 그때 어찌 그랬든지 간에 하여간 되도록이면 말이야, 새 사람을 상을 주라고 말이지.
누더기 같고 헌 사람 자꾸 역사를 캐가면서 말이야. 10년에 어땠소, 20년 전에 어땠소
하는 것만이 표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다음으로 해도 좋으니
정말 새싹회에 새싹이 누가 없느냐고 응? 그걸 감상해보라고 내가 그랬죠.
- 네.
- 아이, 소파 묘지에 가자고 하는 데는 참 어쩔 수 없고.
- 소파 선생님도 뭐...
- 그렇죠, 동료죠. 색동회의 동료지. 후임이거든. 그래서 거길 갔었어요. 망우리.
망우리 소파묘지 아래에서 제1회 소파상을 내가 탔습니다.
- 이,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어린이날 됩니다.
- 네.
- 선생님, 이, 저, 어린이날 되시면 또 감회가...
- 전 감회 깊습니다.
- 어린이날이라고 하면은 참 오월단오기도 한데 말이지. 근데 종전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게 그저 북만 두들기지 않았던가.
모종의 행진만 하지 않았던가. 응? 이것은 그날만이 어린이날이 아니란 말이다. 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이 돼야 한단 말이야. 그러고 또 동시에 그 어린이날이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길러 왔느냐. 또한 장래를 어떻게 등 밀어 주었느냐 말이야.
여기에 대한 성인들의 자기네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업적을, 응? 비판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따라서 어린이의 그날을 아주 기껍게
또한 장하게 앞으로 내딛을 수 있는 기초를 그날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나 자세가 보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거는 좀 부쳐요. 그러면 그저 잠자코 있다가 말이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한 번 떠든다. 꿈벅 죽는다.
이, 어떻게 어린이날이 되나요? 그래서 내가 신문사, 잡지사 혹은 아는 친구들을 만나면 좀 의의 있는 어린이날을
금년도에 만들어보자고 그러는 나머지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내가 할 일은 뭐냐? 거기다가 내가 한
5,6개월 전부터 천천히 목표를 두고서 천천히 걸어 나온 것이 이 50곡을 작곡도 했고 가사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근근이 목표해온 내 일은 쬐그마한 거나마 하나 마친 셈이죠.
- 네네.
(아이 목소리)
- 좀 더 선생님하고 오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되고 해서 가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저, 골치가 아프든지 하면 선생님 댁에 좀 놀러 나오겠습니다.
- 네. 수월치 않은데 나오시겠다니 거 감사합니다. 이 먼 데서 이렇게 오셔서 참 미안합니다.
- 그만 전,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 네.
- 안녕히 계십쇼.
- 안녕히 가세요.
-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 안녕히 가세요.
- 이렇게 오늘은 반달을 지어주신 윤극영 선생님 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주
다시 뵙기로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십쇼.
(음악)
(광고)
(음악)
두꺼비의 일요방문. 삼일제약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
(입력일 : 2011.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