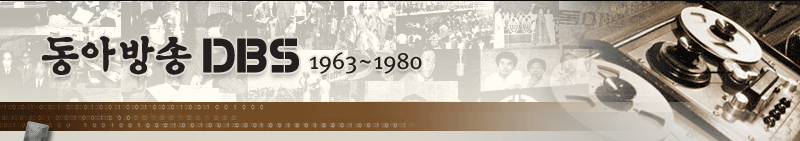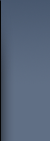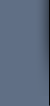|
고은정 극본, 이규상 연출 스물 두번째.
- 아휴, 어서 오시라요. 몇 분 이십네까?
- 혼자에요.
- 아휴, 근데 자리가. 아이 가만 계시라요. 저 쪽에 혼자 오신 손님 한테 양해를 구해 볼 테니까요.
- 석달 간의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전 심신이 녹초가 돼있던 때였습니다. 얼음이 동동 뜬 냉면 생각이 간절해지는 더위 였습니다. 냉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생각으로 진국에 들어서니까 모두 익숙한 한국 사람 얼굴 이에요. 더러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인사를 나누구 몇 마디 의사소통을 하면은 모두가 금방 사돈의 팔촌 벌 쯤 될 거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아는체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아휴, 미안 합네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갔시요? 곧 자리가 날 거야요.
- 이북 사투리를 그대로 미국까지 수출한 냉면집 마나님이 겸연쩍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까지 늘어진 장발에 금테 안경을 장님처럼 코에 걸친 한국 청년이 자기가 먹고 있는 테이블에 새 손님 앉는 것을 거절한 모양 이죠? 힐끗 돌아 봤을 때 같은 한국 사람 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거절을 했다는게 괴씸 하더군요.
- 아니 참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 먼 타국에 까지 와서.
- 그러고 보니까 냉면집에 가득히 앉은 손님이 거의가 같은 한국 사람인데 서로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오다가다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같은 한국 사람 이라고 모두 아는 체 하면서 살던가요? 똑같았습니다. 단지 여행하는 입장에서 볼 땐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동포니까 누구든 아는 체 할 거 같고 특별히 반가워 할 거 같은 착각을 한 거죠.
- 익스큐즈 미.
- 블루진 바지에 티셔츠 차림인 아까 그 청년이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지나치면서 제법 서양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코 밑에 수염을 열심히 기르고 싶은데 아직 뜻 대로 나 주지를 않아서 듬성듬성 솜털 같은 수염을 달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아는 얼굴 같았어요. 아니 어디서 본 얼굴 이었죠. 가만, 쟤가... 아니야.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거겠지 뭐.
- 냉면 한 그릇 주세요.
- 네. 거 냉면 한 그릇 올리라우 맛배기로.
- 어서 오세... 아유 어서 오라우. 거 오랜만이구만. 이리 앉으라우.
- 아니 저...
- 여전 하시지요? 손님도 많구.
- 에휴, 우리야 밤낮 그렇지 뭐. 아무래도 우리 교포가 많아지니까니 냉면 찾는 사람도 늘어나긴 하디.
- 아 그러시죠.
- 저 실례지만 나 수화... 어머나. 어머나 이게 누구니? 맞구나? 너 수화야?
- 어머나 어떻게 된거니? 널 여기서 만나게. 응?
- 서로 아시는 사이 였구만?
- 우린 그렇게 만났습니다. 3년 전에 동부 뉴저지로 떠난 친구를 서부에서 만날줄을 꿈에도 몰랐죠.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에서 동부 뉴욕 까지는 에어버스 점보 비행기로 날아도 여섯 일곱 시간은 실히 가야하는 거립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도 일생동안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래요.
- 아이고, 세상에. 아 이렇게 만날 줄 몰랐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 미국 이 먼곳에 와서 내가 운전하는 차에 널 태우다니 세상은 참 넓은 것 만도 아니다.
- 그래 너 지금 어디로 가는거니?
- 어디긴 어디야 우리집이지.
- 너희 집? 아니, 이리로 언제 이사 했어?
- 얼마 안됐어. 두어달 됐나?
- 그럼, 너 혼자?
- 혼잔 왜 혼자야. 아이들하고 다 같이 왔지.
- 그럼 저 순석 씨, 햄릿을 어디계셔?
- 어. 그 이만 안 왔어.
- 너 사실인가 보구나?
- 뭐가?
- 재혼 했다는 얘기.
- 재혼?
- 그래. 미국 사람 하고.
- 흐흐... 흐흐흐...
- 얘, 나 호텔로 데려다 줘. 너희 집은 다음에 가지 뭐.
- 왜? 깜둥이 신랑 보는거 거북해서?
- 뭐야?
- 바람이 나서 미국 사람 하고 연애 하다가 퇴짜 맞고 깜둥이 한테 시집 갔다면서?
- 너 지금 누구 얘기 하는거니?
- 내가 그랬다면서?
- 아니, 누가 그래?
- 서울에 그렇게 소문 나 있다는 얘기 다 들었어.
- 얘, 소문은 소문이고 어떻게 된거야?
- 그렇게 된 거야.
- 아 그럼 진짜란 말이야?
-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반반이야.
- 허이 참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 어쨌든 우리 집으로 가자. 니가 거북해 할 깜둥이 신랑은 없으니까 안심하구.
- 수화의 긴긴 얘기는 이래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 이렇게 지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얘기 같지가 않고 꼭 남의 얘기 같다.
- 그래서 순석 씨 차가 차이나 타운엔 왜 있었던 거야?
- 여보세요? 어 어 누님 이세요?
- 어. 왜그러지?
- 아 저 조금 아까 고모부가 전활 주셨는데.
- 뭣 때문에.
- 집에 차가 차이나 타운에 서 있는걸 봤다고 하셔서 말이에요.
- 차이나 타운?
- 네.
- 그런데?
- 아니 저 확실히 보신건가 하구요.
- 아 거기 있길래 그랬겠지 리키가 없는 말 했겠어?
- 글쎄 그 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왠일인가 싶어서요.
- 수화, 그렇게 남편 피곤하게 좀 하지마. 응? 뭘 그렇게 시시콜콜이 참견에 간섭에 아휴, 지겨워서 정말.
- 무슨 말씀 이세요?
- 순석이 얼굴 못 되는 것 좀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 나 지금 바빠서 긴 말 못 하겠는데 제발 순석이 우리 집에 와서 푸념 좀 안 하게 해줄 수 없겠어?
- 어머나, 아니 기가 막혀서 정말.
- 무슨 전화야?
- 어머, 어머나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문 소리도 못 들었는데.
- 문 소릴 안 내서 미안하군. 그래도 때 마침 전화가 끊겼으니 다행이겠어.
- 네?
- 집에 와서 한가하게 전화 받으시려고 들어 온건가? 그렇게 약속 이라도 됐던 거야?
- 당신, 저 한테 오리발 내밀고 싶은 모양인데요. 그러지 말고 당당해 보세요. 대낮에 차이나 타운엔 무슨 일로 가 계셨죠? 설마 중국 사람들이 우리 물건 사 갔을 리는 없고.
- 대낮에 간게 잘못이면 한 밤중에라도 가 있을까? 그러면 모든 일이 원대로 풀리겠어?
- 뭐에요?
- 치사 하다고 치사해. 흐물흐물 문어다리 처럼 감겨오는 여자가 있어도 동하지 않을 내가 치사하단 말이야.
- 왜 이래요?
- 앙큼하게. 뭐야? 미국 사람은 얼굴이 모두 비슷 비슷해? 왜, 요트에 같이 타고 유람을 못 해서 가슴이 아팠다고 전활 하던가?
- 수,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수가 내 요트에 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텅 비었던 요트가 가득 찼을 텐데요. 수영복을 입은 수가 대서양 물 위에 두둥실 떠 있는 모습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 이었습니다.
그랬어? 그러더냐구.
- 헤밀턴 이란 사람은 정말 애매하게 그 이의 라이벌이 된거야. 날 사이에 두고 무슨 사랑 싸움을 벌이기라도 한 것 처럼.
- 글쎄. 니 얘기 못 알아 듣는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그럴 사람 아니지 않니? 순석 씨 말이야.
- 헤밀턴 씨가 영호 자전거 사준 얘기 내 했지? 우리가 미국에 닿자 마자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 때 그 인 먼저 일년 가깝게 미국에 살았어도 처음보는 일이라고 몇 번이나 그러든. 미국엔 상놈, 못된놈, 남의 일이라곤 털 끝 만치도 모르는 사람, 전철에서 한 낮에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가도 다른 칸으로 피할 줄 밖에 모르는 망종들만 사는 곳 이라고 무조건 단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 그런데 헤밀턴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무조건 기분 좋은 일 일수가 없었겠지. 자기 믿음에 혼란이 와야 했으니까.
- 누구냐? 영아냐?
- 어머니, 집에 계셨군요?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콜드 누들 사드리려고 했는데.
- 콜드 누들, 냉면의 미국식 이름이죠. 코 밑에 솜털같은 수염이 듬성 거리던 청년, 그 새 튀기 아닌 튀기로 자란 영호의 얼굴이 그래서 낯이 익었던 모양 이에요. 냉면 집에서 말이에요.
- 극본 고은정, 연출 이규상 인생극장 에즈베리 파크의 저녁놀 스물 두번째로 고려식품, 삼성제약 공동 제공 이었습니다.
(입력일 : 200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