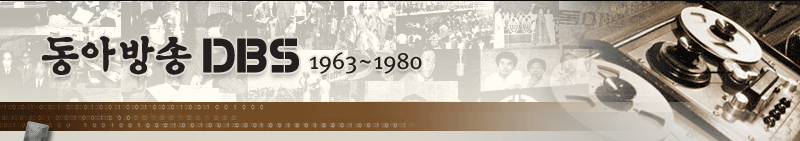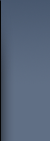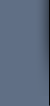|
고은정 극본, 이규상 연출 스물 한번째.
- 그 이가 그래도 그 때 까진 마음에 걸리는데로 터트리고 할퀴고 있는 그대로 쏟아 부었단다. 말하자면 곰거나 째지거나 어쨌든 눈에 보이는 외상인 셈 이었지.
- 그렇지만도 않았지 뭘. 쓰레기 주머니에 버린 후리지아 꽃 묶음 같은 건 끝내 터트리지 않았잖아.
- 그건 무언중에 내가 이미 알고 있으리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한 거지. 숨긴건 아니야.
- 왜, 좀 버리면 어때. 그깟놈의 꽃. 우리집에 어울릴 형편도 아니지만 미친놈 처럼 생판 아무 관계도 없는 자식이 꽃다발은 왜 불쑥 내밀어.
- 만일에 우리 사이에 꽃 얘기가 나왔데도 그 인 이렇게 말했을 거야.
- 나도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짐작은 한다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건은 밖으로 터트려 이를 짚었어야 아물 가망이 있지. 속으로 곪게 해선 안됐던거 아니냐? 하찮은거 하나라도 말이야. 또 누가 알아? 뒤 늦게 꽃 얘기가 나왔을 때.
- 하하 하하하하. 미안해. 헤밀턴이 당신 한테 전활 받고 왔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해서 말이야. 나 모르는 전활 언제 했나 하고. 그래서 어차피 누이도 안 가져간 꽃 내다 버리자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우습더군. 미안해. 여기 와서 자꾸 옹졸해지는 마음을 당신이 이해해 줘야지. 어떡 하겠어.
-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수화 내외 엉킨 매듭이 풀릴려면 말이에요. 아 참, 아시죠? 제가 여행을 하면서 우연치않게 중국집 챠우챠우에서 순석의 누이 헬렌을 만났던 일 말이에요.
- 그래. 언제쯤 한국에는 돌아 가세요?
- 아 네. 여기저기 다닐려면 앞으로 한 달쯤 있어야 될거 같아요.
- 네. 이럴 때 고국에 안부 전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 한국엔 친철 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군요?
- 그렇답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가족이랑 모두 이리로 왔어요. 일년 쯤 됐죠.
- 어, 그러세요? 이런 외국 땅에서 남매 분이 가까이 계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한결 든든 하시겠네요.
- 미쳐 끝을 흐려버리는 헬렌의 말에서 뭔가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오필리아 나수화의 시누이라는 사실도 그 때 알았어야죠. 그랬더라면은, 아이 하긴 뭐... 좀 일찍 알고 늦게 알았다고 해서 친구의 힘으로 수화 내외 인생이 좌우 될 순 없었겠죠?
(따르릉~)
- 여보세요?
- 헬로우?
- 네. 어디세요?
- 거기 미스터 케이 있지요?
-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 케이 전화 받어. 묘령의 아가씨야.
- 주문 전화 겠죠?
- 아닌거 같은데?
- 여보세요?
- 어. 케이. 나 말이야 팬 케잌.
- 아, 네네. 아 정말 그 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화도 못 드리고.
- 지금 전화받은 여자 스톤의 와이프야?
- 아니, 스톤 이라니 미스트 변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군요.
- 아하하하. 아이 그럼. 내 단골 가겐데 주인 이름을 모르면 되나.
- 네. 말씀 하세요. 뭐 드릴까요?
- 스톤을 주문하면 어떨까?
- 아 여기 스톤이란 물건 없습니다.
- 왜이러지? 스톤은 알아요. 내가 필요한게 뭔지. 스톤 한테 전해줘요. 내가 필요한거 주문 했더라고. 알았어요?
- 아니, 이 노파가. 별안간 돌았나 어떻게 된거야?
-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감사 합니다. 아니 무슨 전화가 그렇게 길어? 데이트 신청이야?
- 아니요. 네. 신청은 신청인데.
- 케이, 저 선반에 비닐 봉지를 좀 내려줘. 점심 전에 이 배추하고 오이 모두 포장 하려면 바쁘겠어. 케이, 왜 그렇게 멍해 있는거야? 그렇게 감동적인 전화야?
- 네? 하하하하. 아니요.
- 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 네. 시커멓게 먹칠을 하셨군요.
- 뭐야? 아니 새벽에 분명 세수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가만 거울이 어딨나.
- 흐흐흐흐.
- 괜히 사람 놀리고 있어.
- 수화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는거 같았습니다. 윤기 라고는 씻은 듯 없어진 피부에 한가닥 거미줄 처럼 번져있는 눈가의 잔주름 그리고 목에는 꼭 맞는 목걸이를 두른것 처럼 가느다란 줄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상아빛의 우아한 수화의 목은 블루진의 작업복과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막 늘어지려는 턱 밑을 외줄기의 금선이 뚜렷할 뿐이었죠.
- 뭐, 시장에서 핫도그를 하나 먹었을 뿐이야?
- 헤밀턴 씨, 산다는게 뭘까요? 영호가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서른 바늘을 꼬매도록 상처 입었는데도 저희 아버지라는 남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질 못해요.
- 수의 심정 알만 합니다.
- 밤낮 오렌지 한 상자, 감자 한 파운드 남의 집에 배달이나 나가고. 지금도 배달 간지 몇 시간 째 전화 한 통화가 없는 거에요.
- 미스터 변, 성격적으로 조울증이 있나 보죠?
- 모르겠어요.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와서.
- 이상이 있으면 한 번 카운셀링을 받아 보시죠. 이 곳 사람들은 대부분 주치의가 있어서 상의를 합니다. 노이로제 쯤은 질환 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 그래 임마. 노이로제는 병이 아니야. 노이로제는 병이 아니야. 노이로제는 병이 아니야!
- 엄마, 엄마.
- 왜 이렇게 수선이냐?
- 서울에서 편지 왔어. 조 선생님이 하신거야.
- 뭐라고 하셨니?
- 편지함에서 곧장 가지고 오는 거야. 가슴이 두근 거려서 뜯을 수가 없어.
- 뭐?
- 조 선생님은 작문을 가르치셔서 편지를 그렇게 잘 쓰시나봐. 난 다른 애들 편지 볼 땐 안그러는데 조 선생님 편지는 볼 때 마다 눈물이 나거든.
- 아하하. 어디 오늘은 엄마도 좀 같이 보고 울자.
- 가만있어.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야 돼.
- 아무래도 봉한 자린 뜯어야 될거 아니니?
- 아니야. 김에 쏘이면 고대로 펴지는걸? 아, 안되겠어. 나 혼자 내 방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엄마 보여줄게.
- 영아야, 어른들의 세계는 네가 아직 모르는 복잡한 일이 많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불미한 일로 혹 잘못 되신다 해도 너는 너대로 네 앞길을 잘 걸어 나가도록 해라. 부모 핑계를 댈 만큼 영아는 어리석은 아이가 아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굳게 믿으니까.
-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어? 엄마, 이게 뭐지?
- 이거라니. 그건 편지 아니냐?
- 아이...
- 왜그래?
-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야? 우리집에?
- 뭐? 어디 보자. 이게 왠일이냐? 너 선생님 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길래 이런 답장이 왔니?
- 난 저번에 바다에 놀러 갔던 얘기밖에 안했는걸?
- 바다에?
- 바다에 엄마하고 나는 물에서 둥둥 떠 있었는데 요트가 하나 있었고 거기 월남 아이들이 타고 있어서 나도 타 보고 싶었다고 그 요트는 우리하고 잘 아는 헤밀턴 씨 거였지만 우린 그냥 안 타고 집에 왔다고 썼단 말이야. 내가 잘못 쓴거야?
- 아니, 넌 잘못 한거 없어.
(따르릉~)
- 여보세요?
- 어. 미세스 변 이지? 나 리키야.
- 네. 왠일 이세요?
- 왜 일찍이 집에 가 했어? 어디 아픈가?
- 아니에요. 학교로 영아 데리러 가는 편에 그냥 묻어 왔어요. 좀 있다 나가 보지요 뭐. 해 있는 동안은 걸어 다녀도 괜찮아요.
- 스톤이 차가 차이나 타운에 있길래 나는 그리로들 저녁 먹으러 갔나 했지. 네. 알았어요. 또 하지. 응.
- 아니 저 여보세요? 여보... 차이나 타운?
- 극본 고은정, 연출 이규상 인생극장 에즈베리 파크의 저녁놀 스물 한번째로 고려식품, 삼성제약 공동 제공 이었습니다.
(입력일 : 200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