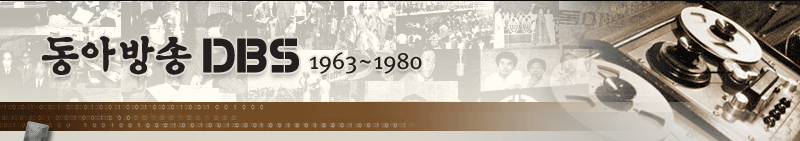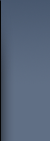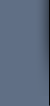|
고은정 극본, 이규상 연출 열 여덟번째
- 여보. 여보. 나갑시다. 응? 일어나.
- 몇 시에요?
- 3시 50분이야.
- 영호는 잘 잤나 모르겠네.
- 잘 잤겠지 뭐. 병원에서 어련히 잘해주려고. 자, 일어나. 응? 내 커피포트 꼽을 테니까 당신은 찬 타월로 얼굴이나 좀 눌러. 부어서 꼭 벌에 쏘인 사람 같군.
- 아우 정말 눈이 뻑뻑해서.
- 당신, 옛날에도 그렇게 잘 울었던가? 왜그렇게 울보가 됐지?
- 괜히 우는 사람이 어딨어요?
- 그러니까 여기와서 울 일이 많아졌다는 말이군. 전엔 울 일이 없었는데?
- 그렇게 되나요?
- 사람이 눈물이 흔해진다는건 뭘 의미하는지 알아?
- 뭘 의미해요?
- 그만큼 마음이 해퍼졌다는 증거라구.
- 네?
- 생각 해 봐. 한참 사춘기 땐 구름에 달이 가려지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법이잖아?
- 어머나, 그럼 제가 사춘기란 말이에요?
- 더 들어봐. 사춘기 땐 그렇게 눈물이 흔하다가 자라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생활 전선에 들어서면 어느새 눈물집은 발 뒤끔치 처럼 두꺼워져서 왠만한 일엔 끄떡도 안하거든? 남의 초상집에 가서도 침 발라서 우는 시늉을 할 정도가 되는거지.
- 아이 참. 아무리 침까지 발라서 울까요.
- 그러다가 언제 다시 눈물 주머니가 말랑말랑하게 되느냐 하면 말이야.
- 네. 언제 그렇게 돼요?
- 단단한 마음에 틈이 생길때지. 그 틈으로 공기가 새듯, 눈물 주머니에 바람이 솔솔 빠져서 다시 말랑말랑해지는 거라구.
-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눈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 눈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게 아니고 당신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 자, 빨리 나가자구. 가서 영아도 깨우고.
- 영안 오늘 일요일에 학교도 안 갈텐데 왜 깨워요?
- 그렇던가? 연중무휴 일을 하다 보니까 요일 가는것도 모르겠군.
- 여보, 한 가지 청이 있는데요.
- 뭔데?
- 우리 제발 한 달에 한 번 정도 놉시다.
- 놀아서 뭐하게?
- 뭐하긴요. 그냥 쉬는거죠.
- 쉬는건 밤에 쉬면 되잖아.
- 이게 어디 쉬는 거에요. 죽지않을 만큼 눈만 붙이는 거지요. 정말이지 요샌 왜 사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사는거야 무슨 이유가 있나? 그냥 사는거지.
-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하루만 쉬어요 좀.
- 안돼. 당신 마음에 틈이 생겨서도 쉬어선 안되겠어.
(따르릉~)
- 여보세요.
- 아이구 원 일요일 같은 때는 좀 천천히 나올거지. 원 수화는 있으려니 생각도 안하고 전화를 한건데.
- 바꿔 드려요?
- 아니, 뭐 누가 받아도 괜찮은 거야. 우리 오늘 비취에 나갈까 하는데 멀지도 않고 하니 몇 시간 이라도 문 닫고 같이들 나가자고 말이야. 어때?
- 글쎄요. 바꿔 드릴게 말씀해 보세요.
- 무슨 얘긴데 그래?
- 아 저, 받아 보세요.
- 여보세요? 누이 예요?
- 어. 말야, 거기 에즈베리파크 해변이면 너희는 바로 집 앞이니까 말이다 가게 몇 시간만 쉬렴. 리키가 영호도 그렇고 우울한데 한 턱 쓰겠단다. 어떠니?
- 글쎄요. 영호 일어나면 한 번 같이 나가죠 뭐.
- 얜? 아 시즌 다 놓치고 바닷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할거면 뭣하러 가니? 눈으로야 뭐 아침 저녁으로 보는건데.
- 하여튼 준비 되시는데로 이리 오세요. 와서 상의 하지요.
- 어. 알았다.
- 어쩐 변덕이야?
- 그게 무슨 변덕 이에요? 누님 내외야 주말이면 늘 있는 행사 아닌가요?
- 우리도 누님 만큼만 재산이 생기면 그 땐 매 주말마다 쉬자구.
- 앞으로 19년 후에요?
- 19년은 뭐야?
- 누님 20년 모은 재산이니 우리도 그만큼 되려면 잘해서 20년 그 중에서 1년은 이미 들어선 셈 치고 앞으로 19년 아니에요? 벼락부자 되는 일은 죽어도 없는 땅이니까.
- 그러고 보니 너무 아득하군. 그래, 용단을 내리자. 당신, 집에 전화해요. 영아 나오라고.
- 케인 어쩔까요. 하루 쉬라고 할까요?
- 그 녀석이야 뭐 지가 쉬고 싶으면 맘대로 쉬는 녀석인데. 오늘 같은날 그냥 가게 보고 있으라지 뭐.
- 아 들어요. 작게 말씀 하세요.
- 무슨 말인줄 알고 들어?
- 저번에 보니까 한국말 다 알아듣던 데요?
- 케이, 케이 뒤에 있어?
- 다녀들 오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 가게 볼테니까요.
- 저것 보라니까요.
- 저런 엉뚱한 자식 봤나.
- 이야, 그 고기 굽는 냄새 코 찌른다. 하하하하.
- 저 이는 한국식으로 양념한 바베큐를 나보다 더 좋아 한단다. 하하하.
- 아무리 좋아 하기로 하필이면 누이하고 비교를 해요.
- 오, 그러게 말이야. 나 한국식 바베큐 좋아하고, 헬렌도 똑같이 좋아한다. 하지만 헬렌 요리 아니다. 헬렌이 만들어준 요리 먹을 때 헬렌보다 더 좋아 하는거 뭣이 나뻐? 어?
- 아이고 그래요. 맞았어요. 맞았어. 어서 많이 드시고 아프다는 말이나 마세요.
- 정말 매형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 어? 어 아니. 인제 다 나아했어.
- 늙어 가느라고 그러지 뭐.
- 누이도. 매형이 왜 늙으세요?
- 아 내일 모레면 쉰 인데 시지근 할 때도 됐지 뭘.
- 아이고 그런소리 말어. 여기 사람들 나 서른살 밖에 안 본다 이거. 하하하하.
- 아 그렇게 보기만 하면 뭘 해요?
- 정말 여기와서 제 나이 잊어버리는건 다행이에요.
- 그런 점은 있지. 아이구 얘, 아이구 이거 탄다. 어서 먹어라. 아이 가만, 이거 수화하고 영아는 아주 물 속에서 사는구나? 원 시장 하지도 않나?
- 엄마, 여기 파도는 참 순해.
- 순해?
- 응. 그전 때 우리 경포대 갔을 때는 파도가 너무 세서 막 밀려 나갈거 같았었어.
- 그 땐 니가 어렸으니까 그랬지. 어렸을 땐 넓어 보이던 골목도 크고나서 보면 좁다랗지 않던?
- 아하하하. 그래도 여기 바다는 너무 순해.
- 미세스 변, 미세스 변 아니십니까?
- 어머나, 아니 누구냐? 저 요트에 있는 사람이.
- 어머나, 헤밀턴 아저씨 아니야?
- 그래?
- 오, 영아도 왔군요. 아하하하.
- 엄마, 요트에 폴츄리칸 같은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 폴츄리칸이 아니야. 월남 아이들 이에요.
- 잠깐 계세요. 그리로 갑니다.
- 영아야, 그만 나와. 영아야!
- 엄마, 아빠가 찾아. 그만 들어가자.
- 그래. 근데 어떡하지?
- 왜 엄마?
- 아니야. 들어가자.
- 영아 오늘 신났지?
- 네. 바베큐도 맛있었구요.
- 정말 너무 포식을 했나봐요.
- 야외 나와서 포식 하는건 괜찮아. 병 안생긴다. 헤헤헤.
- 여기 사람들 정말 음식 해 먹을 줄 모르는것 같아요.
- 아무리 냄새가 맛있어도 어쩜 그렇게 그냥 달라 그래요? 거지들 처럼?
- 그래서도 야외에 나오려면 으레 고기 양념을 넉넉히 한단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먹어보자 그래서 말이야.
- 어쨌든 여기 놈들이 양반은 아니에요.
- 그 전에 한번 포코로 호수에 놀러갔을 때는 우리 갈비 굽는 냄새 맡고 모두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맛도 제대로 못 보고 왔잖아?
- 하하하하.
- 엄마 참, 헤밀턴 아저씨 못 보고 왔잖아.
- 아니.
- 누구? 헤밀턴?
- 아니에요. 멀리 요트에 탄 사람이 헤밀턴 씨 같다고 영아가.
- 영안 아직도 미국사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나?
- 아니에요.
- 정말 처음엔 여기 사람들 구별이 잘 안되더군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게.
- 우린 이쯤에서 내리죠.
- 아니, 영호 병원에 간다고 했지 않니?
- 어차피 가게에서 차 가지고 와야지요. 이따가 오려면.
- 어. 우리도 병원에 갈건데 뭘 그래?
- 엄마.
- 영아 얼굴이 빨갛게 익었구나? 내일 새벽에 일어나려면 고단해서 어떡하니?
- 수화는 까닭없이 영아의 입을 막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요트에 타고 있는 헤밀턴 씨의 얘기, 하등 숨길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화제에 오르지 않는걸 원했던 거죠. 필요이상 신경을 세우고 있는 남편 변순석을 거슬리지 않겠다는 마음, 어쩌면 이런 작은 일들이 상황을 얼마나 악화 시키고 있다는걸 미쳐 몰랐습니다.
- 장미자, 김수희, 김규식, 오세홍, 설영범, 안경진, 장광, 나레이터 고은정, 음악 이훈, 효과 심재훈, 장준구, 기술 이원섭.
극본 고은정, 연출 이규상 인생극장 에즈베리파크의 저녁놀 열 여덟번째로 고려식품, 삼성제약 공동제공 이었습니다.
(입력일 : 200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