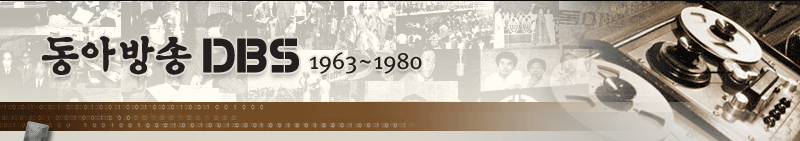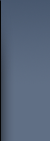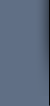|
고은정 극본, 이규상 연출 아홉번째
- 영아야, 너 얼른 집에 가서 페인터 깡통 마저 가져 온.
- 어딨는데요?
- 현관 신발장 위에 있어요.
- 엄마, 놔 두세요. 요거 마저 칠하고 제가 사이클로 갔다 올게요.
- 엎드리면 코 닿을 텐데 무슨 사이클이니? 얼른 넌 칠이나 하고 있어. 무슨일 있어도 오늘은 수리가 다 끝나야 돼요.
- 여보, 거기 굵은 못 몇개만 더 골라봐요. 아무래도 이 못은 약해서 안돼겠어.
- 아까 다 골라 쓴거 같은데. 옳지. 여기 두 개 있다. 두 개 더 있으면 되겠어요?
- 글쎄. 두 개만 더 밖아 노면 그런데로 붙어있기야 하겠지. 아 근데 바람이 세찰 때가 문제란 말이야.
- 바다가 있어서 바람이 그렇게 센가보죠?
- 뭐 바람이 세긴 해도 기분 나쁘지 않으면 다행이야.
- 무슨 기분이요?
- 거 있잖아. 뱃속까지 소금에 저려지는거 같이 축축하고 찝질한 바닷 바람. 이쪽 바람은 습기가 안 느껴지잖아?
- 그래서 농작물들도 잘 되나 봐요.
- 아, 그러고 저러고 야단 났네. 시작은 해 보는거지만 새벽마다 안개 헤치며 채소 실어나갈 생각 하니까 벌써 허리가 휘는데?
- 처음엔 조금씩 하지요 뭐.
- 처음에 조금 놓고 시작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할까?
- 네.
- 물론 가까운데서 채소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워낙에 땅이 넓으니 몇 백 마일 밖에서도 쇼핑을 오잖아. 그런 사람들 한테 이 가게는 있는것 보다 없는게 많다는 선입관을 갖게 하면 안된단 말이야.
-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네요.
- 콩나물에서 딸기까지 처녀 망태기만 빼 놓고 다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 아 뭐만 빼 놓구요?
- 음? 어. 아냐. 그냥 한번 해 본 소리야. 우리끼린 열심히 한국말 해서 한 마디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거 아니야? 구수한 우리 쌍소리 까지도 말이야.
- 당신, 여기 오셔서 정말 안 점잖아 지셨어요.
- 그러길래 젊잖아. 얼마나 좋아. 사시사철 늘 푸른 소나무 처럼.
- 아하하. 비유는 근사 하시네요.
- 아 됐어. 뭐 이 정도면 왠만한 바람쯤엔 꺼떡 않겠지?
- 하하하하. 이 가게 다 돼 했구나.
- 어서 오세요 고모부.
- 아이 왠일이세요 이 시간에.
- 어. 차이나 타운 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찰리가 물건 아주 못 사와 핸다. 스톤이 없으니까 우리 가게 망해 핸다.
- 아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 안으로 들어 가세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시고 가셔야죠.
- 어. 그렇게 할까? 내 일러 줄 얘기도 있고 하니까.
- 그렇게 하면 몸은 조금 고단해도 이 맘이 나아 핸다. 알아 했어 스톤?
- 그 농장 주인이 어디 사는데요?
- 차이나 타운 살아 해지.
- 그런데 그 농장이 너무 멀어서 매일 새벽 다니려면 차이나 타운 근방 이랬으면 좋겠네요.
- 아하. 그렇게 가까우면 자기네가 직접 가게 내고 팔아 해지.
- 여보,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직접 갖다가 포장을 해 팔면 배달 받아서 파는거 보다 곱절이 더 남는다는 말이죠?
- 아! 바로 맞았어 해.
- 당신, 매일같이 채소 다듬어서 저울에 재고 포장하고 할 수 있겠어?
- 그거야 남들 하는 일이면 저라고 못 하겠어요?
- 힘들어 해도 이 많이 남아 해야 채소 장사 하는거다. 하루 지나면 값이 내려가 해지. 또 하루 지나면 더 내려가 해지. 잘못하면 채소 많이 먹어 해기만 하고, 돈이 돈이 하나 없어 핸다.
- 고맙습니다. 이렇게 까지 걱정해 주셔서.
- 아니 뭣이 고마워 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 하는거지 뭐. 하하하하.
- 하하하.
- 헬렌, 좋은 누이다 이거. 요샌 밤 잠도 잘 못자 해지.
- 너무 걱정 말라 그러세요.
- 외가네 농장도 나 기억하지 못 해 하는데 누이 생각 해내고 전화 했단 말이야.
- 헬로우? 아 여보세요? 위스 농장이죠? 거기 채소가 몇 종류나 재배되고 있습니까. 네. 과일 종류는요? 아 네. 아 아니에요. 그냥 사 볼까 하구요. 네? 배달은 안해요? 알았습니다. 또 연락 드리죠.
- 아 감사 합니다. 35불 되겠습니다.
- 땡큐. 여깄습니다.
- 또 오십시오.
- 저 들어오다 보니까 노란 사이클이 있던데 혹이 이 댁 아드님 겁니까?
- 아니요. 우리 조카 아이 거에요. 왜 그러시죠?
- 아니, 아 그저 반가워서.
- 반가워요?
- 조카 되는 소년이 아주 귀엽게 생겼죠?
- 그런데요. 아, 저 혹시 그 자전거 사 보내신 분 아니신가요?
- 아하하하. 맞습니다.
- 어머,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잖아도 걔 엄마가 몇 번이나 댁으로 감사 전화를 드렸는데 번번이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서 궁금 했어요.
- 어, 그 소년의 엄마가 있습니까?
- 그러믄요. 아빠도 있구요. 걔 아빠가 바로 제 동생 이에요.
- 오, 그거 다행 입니다. 내가 그 날 산책 하면서 우는 소년을 봤을 땐 너무 외로워 보여서 부모가 있으리라곤 미처 상상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 진작에 연락을 한 번 주시지 그러셨어요. 걔 부모 내외가 오션타워 까지 갔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더군요.
- 네. 사정이 있었죠. 여행을 자주 해서 집에 있는 날이 적습니다.
- 아, 그러시군요. 저,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학교 갔는데 좀 있으면 이리로 일 하러 올거에요. 만나보고 가시죠.
- 여기서 일 하고 있습니까.
- 네. 파트 타임으로요.
- 오, 그렇습니까.
- 아 저 잠깐요.
아직 집에들 안 왔군요. 저, 그 애 부모들은 파크 사이드에 채소 가게를 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어서 가게엔 아직 전화가 가설 되지 않았어요.
- 중국 사람들 참 의지력이 대단 합니다.
- 중국인이 아니에요 그 애는.
- 예?
- 한국인 입니다.
- 오, 그래요. 더더욱 반갑 습니다. 나, 코리아에 가 본일 있습니다.
- 어머나.
- 한국 전쟁 때 참전 했었죠.
- 그러세요?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군요.
- 그래서 말이에요. 어차피 내일 고모내외 초대하는 길에 같이 하면 어떨까 하구요.
- 그러지 뭐.
- 근데 어떡하지요? 한국 음식이 좋겠죠?
- 미국 사람이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엄마?
- 우리나라에도 왔었다는데 뭐.
- 야, 그 땐 군인이었을 땐데 우리 음식 먹어 봤겠어?
- 먹어보진 않았을지 몰라도 보기야 했겠지.
- 여기 음식이라는게 뭐 별거 있나? 우리식으로 해요. 불고기도 우리식으로 양념해서 굽고.
- 아이 챠우챠우에서 하던거 처럼 아빠가 하면 더 맛있을거 아냐.
- 그래. 팁만 두둑이 내라. 나도 몇 가지 해 줄 테니까.
- 아하하. 당신도. 가만있자. 떡도 조금 할까요? 빈대떡도 부치고.
- 별안간 녹두를 살 수 있나?
- 돈부 콩가루 파는게 있던데 그걸로 대신 하지요 뭐. 김치하고 돼지고긴 있으니까 고사리는 좀 뜯어오면 되구.
- 엄마 엄마, 약식도 해. 식해, 수정과도 하구.
- 그래. 그까짓거야 뭐 어렵겠니?
- 야, 신난다.
- 영호야, 그 사람 만나면 깎듯이 고맙다는 인사 해야돼. 얘가 공원에서 질질 짜던 아인가 의심 할 정도로 씩씩하고 늠름하게 말이야.
- 알았어요. 그 땐 정말 내가 병신 같았을 거야.
- 오죽이나 측은 했으면 자전거를 대신 사줄 생각이 났겠니.
- 아 아무리 영호가 처량해 보였다고 해도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게 이상해. 여지껏 난 그런 사람 여기와서 본 일이 없거든.
- 한국에 가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나보죠.
- 야, 그 사람은 내가 한국 아이라는 것도 몰랐단 말이야.
- 뭔가 땡기는게 있었던게지 뭐. 그런걸 인연 이라고 그러는 거란다.
- 네. 보이지 않는 힘이 서로를 연결해 주는 인연 이라는거. 왜, 소매만 스쳐도 인연이 닿았었단 탓이라고 그러죠? 수화네가 집을 마련하고 자기들의 가게를 시작한건 미국에 도착하고 그럭저럭 두 달이 다 돼서 라고 그러더군요. 집들이 겸 개업 축하 겸 유일한 손님인 고모내외들 틈에 또 한 사람이 끼었어요. 조지 헤밀턴. 미국에 닿자 마자 우연치않게 영호가 선물을 받았던 미지의 서양 사람이 때맞춰 나타난거죠. 제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만 계속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일 뵙죠.
- 장미자, 김수희, 김규식, 오세홍, 설영범, 안경진, 신성호, 나레이터 고은정, 음악 이훈, 효과 심재훈, 장준구, 기술 이원섭.
극본 고은정, 연출 이규상 인생극장 에즈베리 파크의 저녁놀 아홉번째로 고려식품, 삼성제약 공동제공 이었습니다.
(입력일 : 200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