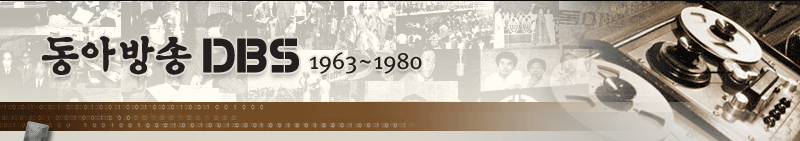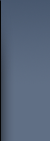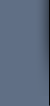|
《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화려하고 대성한 오늘이 있기 까지에는 가슴 설레이며 등장하던 첫 무대가 있습니다.
예술, 문화, 연예, 스포츠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데뷰시절의 얘기들을 국내외 가요와 함께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상희 입니다. 오늘은 나의 데뷰가 꼭 열 세번째 되는 시간인데 어느 분 모셨는지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문화계를 돌아보시고 귀국하신 소설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 정비석 입니다.
- 아, 네. 정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 네. 안녕하세요.
- 일본 다녀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 네. 오늘 닷세.
- 닷세째요. 아직 피곤도 덜 풀리셨을텐데 나와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 선생님을 모시게 되면은 아주 가장 저희들 입에 이 오르내리는 얘기로써는 선생님이 웃는 모습이 아주 무척 특이하다 그래서 가장 그 팬들한테 어필하는게 큰거 같은데.
- 아이 그거 뭐 난 실없는 사람이니까 잘 웃겠죠.
- 아이 별말씀을 다하시네요. 가까이 뵈니까 정말로 아주 인자하신 웃음을 가진 분이신거 같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정 선생님이 맨 처음에 문학을 하시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어려서 아주 어렸을 때 다섯살 때 부턴가 서당에 다녔어요. 서당에 다녔는데 그 때는 뭐 별로 문학서적이라는건 물론 읽을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문을 외웠죠. 한문을 외고 그 때는 서당에 다니는데 밤에도 갔습니다. 그래 밤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때 저희 할아버지가 한 칠십 넘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아주 얘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듣기를.
- 네.
- 그래서 동네에 삼국지에 아주 무불통달한 노인이 한 분 계신데.
- 네.
- 그 분을 저녁마다 모셔다 놓고 뭐 참 식혜도 대접하고 엿도 대접하고 뭐 여러가지 음식을 대접해 가면서 동네 노인들을 모아놓고 삼국지를 입으로 얘기하는거 그 얘기가 여간 재밌질 않아요. 그래 대게 밤에 돌아오는게 내가 서당에서 돌아오는게 9시나 10시 가까이 되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그 얘기가 하도 재밌어서 몰래 뒤에가 숨어서 할아버지가 못 듣게 하니까 숨어서 그 얘기를 저녁마다 들었어요. 삼국지 얘기를. 그러는 동안에 그 참 나도 어떻게 저렇게 얘길 해 봤으면 좋겠다.
- 아 네.
- 하는 그런데서 말하자면 그게 아마 문학의 어떤 취미를 가지게 된 동기겠죠.
- 네.
- 인제 그렇게 어려서는 그래 그 삼국지의 얘기를 듣는데 심취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고, 거기서 조금 더 자라서는 학교 국민학교 다닐 적 부터 그 때는 이제 빨간딱지 춘향전이니 뭐 그런거 였는데 그거 국문을 알면서 부터는 그걸 읽기 시작했고, 또 좀더 자라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때는 중학교를 난 일본 중학을 다녔는데요.
- 네.
- 일본중학 다닐 때 이 저 작문 시간에 어떻게 일본말로도 작문을 잘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한번은 작문 선생이 이 참 특이하게 아주 놀랍도록 잘 지은 작문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한테 한번 들려주겠다고 해서 나는 이거 우리반에서 누가 이렇게 좋은 참 글을 지었나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읽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내가 쓴거에요.
- 네.
- 그래 거기서 참 흐뭇 했는데 나중에 그 돌려준 다음에 보니까 그 빨간잉크 평을 썼는데 참 중학교 2학년생 이라도 이만한 글을 쓰는건 놀랍다. 너는 장차 이 방면으로 나가면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걸 보고나서 야 이제는 난 참 문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자라서는 그 때 우리나라 사람 형편으로 일제시대 거든요. 그래 형편으론 재판관이 되던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해야 판검사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돼서 그저 군수 겨우 올라가야 군수 정도나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고. 근데 내 생각이 결국 실컷 해야 판검사, 판검사 라는건 뭐냐. 판검사 라는건 결국 남이 죄 지은 다음에 죄 지은 그 뒤치닥거리나 해주는것 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남자가 한평생 할 일이 아니다.
- 네.
- 그 다음엔 의산데 의사는 또 뭐이냐 그러면 의사는 난 왜 병난 사람의 뒤치닥거리 밖에 해주는거 아니냐. 결국 건전한 사람 상대가 아니라 이것 역시 병자를 상대하는거니 이것도 역시 사내로서 할 일이 아니다
- 네.
-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거 한국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 네.
- 결국 그 때 생각이 잘 하거나 못 하거나 내 생각한걸 내 마음대로 역시 한 평생 지껄이다가 죽는게 내 생을 가장 참 충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시 나는 문학을 하겠다. 그래서 문학으로 나갔죠.
- 저는 현대판 삼국지를 듣는 기분인데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선생님께서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한 곡 선사해 주시겠습니까?
- 네. `바닷가에서` 인가요?
- 네. 안다성 씨.
- 네. 네.
-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 바닷가에서 - 안다성
- 또 다시 말씀을 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네. 네.
- 그럼 본격적으로 문단에 데뷰하신 것은 언제쯤 될까요.
-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인제 일본가서 대학에 다니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말을 몰랐어요 잘. 그래 일본서 일본말로 써서 일본서 소설이 한번 당선이 됐어요.
- 네.
- 되고 나니까 역시 한 평생 하는데 이거 우리 말로 써야지 남의 말로 써서 되겠느냐. 그래서 일본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말 자습을 했죠.
- 네.
-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는 친구들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가령 돌아가신 소설가 계용묵 씨 라던가, 현재에 계신 허윤석 씨, 지금 이북에 있는 석인해 씨 라던가 또 납치돼 간 채정근 씨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동인잡지를 할라고 그래 선천에서 그 때 참 젊었을 때 밤새껏 술을 먹고 달을 보면서 서로 어깨를 엮고 밤을 새며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닌 그런 일도 있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다가 1936년 인가요. 36년에 동아일보에 신춘문예 모집을 해서 거기다가 투고를 했더니 그 때에 당선 된 것이 김동리 이고 차석으로 된 것이 내 절곡제 였어요.
- 네.
- 그래 그것이 1936년 이죠.
- 네.
- 그러니까 지금으로 부터 31년 전이죠.
- 네.
- 그래 그래서 이제는 나도 자신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잡지사에나 신문사에서 어떻게 뭐 신인대우해서 원고 청탁을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만해도 뭐 오질 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역시 내가 한번 당선돼 본 작품 읽어 본 결과에 나는 내 작품이 신통치 않은 모양이구나.
- 네.
- 아주 그 때는 완전히 실망 했어요.
- 네.
- 이제는 도저히 나는 참 문학자가 될 자격이 없는 모양이다.
- 네.
- 그래서 그 한해 동안은 순전히 밤을 새가며 마작만 했습니다. 아주 문학을 포기하고.
- 아 네.
- 그러다가 연말이 돼서 또 신춘문에 광고가 나는데
- 네.
- 그 마작을 한참 하다가 어떻게 신문을 척 잡아보니까 요새도 크게 나지만 광고가 아주 제1면에 크게 났거든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탁 자극을 느끼면 차후로 내 한번 더 이거 테스트를 해본다.
- 네.
- 그래서 그 때는 마작하다 그만 집어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머릴 싸매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것이 이제 써서 그 해 에는 조선일보에 냈는데요.
- 네.
- 그 다음해니까 1937년이죠. 근데 그게 아주 동아일보에 아 저 조선일보에 당당하게 1등 당선이 됐어요.
- 네.
- 그런데 거기 하나 이제 좀 에피소드라 할까 얘기하고 싶은건 그 때는 손기정이 마라손에 대한 일장기를 삭제한 그 사건으로 해서 동아일보도 정간을 막고 중앙일보도 정간을 막고 신문이라곤 조선일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때 모인거 내가 지금 잊지 않는건 930편이 들어 왔어요. 소설만.
- 네.
- 근데 930편 들어온데서 참 천우신조 했다할까 제목 소설 제목 그대로 서황당이 도왔다 할까 그래서 혼자서 당선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엔 아마 인정이 된 모양이더군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서울 어느 잡지사에서나 신문사에서 뭐 연방 원고청탁이 와요.
- 네.
- 그래가지고 그거 내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다 그저 내가 썼습니다. 그래서 겨우 신인작가가 된 셈이죠.
- 네. 그러니까 데뷰 하신 것은 1936년.
- 네. 36년에 당선 되고 7년에 당선 됨으로써 확인이 됐죠.
- 네. 아마 친구분들하고 달밤에 술을 마시면서 노시던 기억 좀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그런 노래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 네. 네.
- 김치캣의 `신라의 달밤`
♬ 신라의 달밤 - 김치캣
- 아주 먼 옛날을 회상 하시는 듯 하고 계시는데.
- 네. 아마 그게 미스 김이 낳기 훨씬 전일거에요 아마.
- 전 그 때는 낳아 있지도 않았었는데요. 전 정말 아득한 옛날 얘기를 듣는 기분인데. 그러니까 데뷰 하실 때 작품은 둘 다 단편 이었었죠?
- 네. 단편이에요.
- 근데 제가 인제 태어나서 제 기억에 남는것은요. 정비석 씨 하면 우선 `자유 부인`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로 굉장히 인기를 모으셨죠?
- 아마 그 때도 굉장히 어렸을거에요. 아마.
- 그 때도 일곱살인가 였었어요. 저는. 근데 처음으로 그 장편소설이 `자유 부인` 이었었죠?
- 아니에요.
- 아니었었나요?
- 아니었었죠. 당선 된 그 다음 다음 핸가요? 그 때 저 조선일보에서 조간이라는 잡지를 냈는데요.
- 네.
- 그 때 아직 그 때 다른 신인들은 동아일보 하고 중앙일보는 아직 정간 중이었지. 냈는데 비로소 잡지에 `금단의 뉴욕` 이라고 그런 장편소설로 쓴 것이 처음 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다음 해 쯤 되나 다른 신문이 다 참 폐간이 되고 매일신문 하나만 있을 때 매일신문에 `화풍` `꽃 화` 자 하고 `바람 풍` 자 신문에는 그 `화풍` 이라는걸 쓴것이 처음이었죠.
- 네.
-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이십년이 훨씬 이십 아마 사오년 되는군요.
- 네.
-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로 역시 신문에 쭉 오늘날 까지 신문소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문소설 쓰는건 마치 이래요. 매일매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더러 얘길하면 아주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높은 언덕을 참 한걸음 한걸음 걸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입니다. 지금.
- 아 그럼 정 선생님은 매일매일 일기를 쓰십니까?
- 매일매일 뭐 일기는 못 쓰구요. 매일매일 소설을 쓰지요.
- 그게 조금 다른것 같군요. 오늘 아주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네.
- 정 선생님은 많은 팬들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 뭐 글쎄요.
- 가장 선생님 한테 열렬한 팬레터를 보내셨던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글쎄 뭐 그런 분을 여기서 또 공개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해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 감사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네. 감사 합니다.
(입력일 : 200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