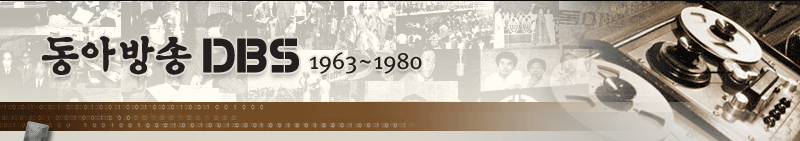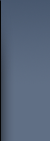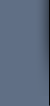|
극본 배명숙, 연출 안평선 열아홉번째.
- 저, 여보세요.
- 네. 어서오세요.
- 저, 농사짓는 연장 좀 샀으면 좋겠는데요.
- 농사짓는 연장이요?
- 네. 호미하고
- 호미하고 또요.
- 호미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 예?
- 농사를 안 지어 봐서요.
- 무슨 농사를 지실려고 그러세요?
- 농사라기 보다...
- 아이 그 필요한게 뭣뭣 인데요. 그 호미하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 뭐든지 땅 팔 수 있는거만 주세요. 못 쓰는 따을 파서 농사를 지을라고 그러거든요.
- 못 쓰는 땅을 파서 아주머니가요?
- 네.
- 아주머니가 농사를? 아니 그것도 개간을 하신다 이 말 입니까?
- 네. 그래요. 왜요?
- 아주머니, 농사 지어 보셨어요? 내가 보기엔 농사 근처에도 못 가 보신거 같은데요.
- 지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든 좀 주세요. 크지 않은 걸로요. 힘이 세지 않으니까요.
- 그 그러죠. 그럽시다.
호미 한 자루, 낫 한 자루, 곡괭이 한 자루를 샀지요. 그라고 도 냄비 한 개 하고 숫가락 한 개도 샀어요. 그걸 사 들고 어젯밤 앉아서 밤을 지샌 그 야산 밑으로 왔습니다.
- 아이고. 아휴, 팔이야.
참말로 한심 하더군요. 그거 들고 읍내서 거기까지 오는데 팔이 아픈디 그 야산을 어떻게 파헤칠까 싶더군요. 하지만 한 숨 돌리고는 얼른 호미를 집어들고 앉은 자리부터 파헤치기 시작 했지요.
- 아휴. 아휴. 아이고, 또 돌이네. 아휴...
- 아줌씨. 아줌씨.
- 나 말씀 인가요?
- 아 여그 아줌씨 말고 또 누가 있다요.
- 아휴. 아이 그렇구만요.
- 아이 시방 여기서 지금 뭣하고 계신거라우?
- 아이 뭘 하긴요. 땅 파지요.
- 아이 글씨 요 쓰지도 못허는 땅은 왜 파헤치신다요? 맨 돌덩어리고 황토 뿐인디.
- 밭을 만들라구요.
- 밭을?
- 예.
- 아 아니 그라믄 지금 아줌씨가 그 뭐이다냐 그 개간이란걸 한다 그 말 인가라우?
- 내 땅이 없응께요.
- 아줌씨 혼자서 말이라우?
- 네.
- 혼자서?
- 아 아니 연약한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이 험한 일을 염두를 냈다요 그래? 예?
- 글쎄요.
이화자 여사는 곡괭이질 하던 손을 멈추고 들판 끝을 아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이 농부가 납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한 많은 지난 날을 구비구비 엮어내지 않고 어떻게 한 마디로 그를 납득시킬 수 있단 말인가.
- 숙자 언니를 찾아 갔다가 헛 걸음을 하고 나는 힘 없이 다시 고향 쪽으로 돌아왔었지요. 하지만 고향에 다시 들어설 면목이 없더구만요. 그려서 정처없이 걸었지요. 걷다 본께 휑한 들판인데 날이 저물더구만요. 날은 저물고 갈 곳은 없고 들판에서 뱅뱅이를 돌다가 본께 멀지 않은 곳에 야산 하나가 있어요. 그려서 그리로 가서 언덕 아래 퍼질르고 앉았지요. 앉아서 밤을 지샜습니다.
헌데 아침이 왔을 때 그녀는 눈 앞에 넘실거리는 끝없는 푸르름에 눈이 부셔왔다. 드넓은 김제 평야, 그 들판에 온통 넘실거리는 보리의 물결.
- 세상에 넓기도 하지. 보리가 어쩌면 이리도 잘 자랐을까. 탐스럽기도 해라. 어젠 아무것도 눈 앞에 안 보이더니. 나도 땅 한 뼘 이라도 있으면 땅이나 파 보지. 땅이나 지적거리며 한 세상 잊어봤으면. 죽어지지도 않는 목숨 이 세상을 어찌 살꼬. 으흐흑.
한 바탕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 왔다. 그러다가 문득 그녀는 기대앉은 언덕을 올려다 봤다. 나무도 제대로 못 자라는 험한 땅이었다. 임자없는 야산. 그녀는 그 길로 읍내 장터 거리로 가 호미와 곡괭이를 사 들고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야산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 아이, 아줌씨.
- 네?
-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 아니에요.
- 보아하니 무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인디. 그건 그렇고 새참을 내왔는디 저리 가서 우리랑 함께 요기나 하십시다.
-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서 가서 드세요. 모두들 기다리는 것 같은데.
- 아이 그라지 말고 같이 한 술 뜹시다. 아이 저 종일봐야 맨 입으로 있는거 같은디. 자자, 어서 가입시다.
- 어따, 올 보리 농사는 떼 논 당상이제. 그제.
- 그람 그렇지요. 허지만 농사도 짓기 나름이죠. 한창 보리밭 멜 때 자슥 군대 보내 놓으니 아 일손이 모자라서 마음이 조급해 죽것다니께.
- 아이고 그렇긴 혀. 미쳐 손 못 보면 손꼬락 새 물 새듯이 새는게 곡식인게.
- 아 그라믄 사람하나 더 사시오.
- 아니 사람은 거저 사는가? 빚내서 농사 짓는데 아 어떻게 사람을 또 사.
- 워따, 아이고 말하는거 본께 그냥 우리나 뼈꼴 빠지게 부리것다 그말이네.
- 움메 엄살은 젠장. 아이 더도 덜도 말고 품삯 가른거 고 같이나 되게 해줘. 더도 덜도 말고잉.
- 어이고?
- 하하하하하.
- 일들도 참 재밌게들 하시네요.
- 아이고, 난 또 누구라고. 어서 오시오. 젊은 양반.
- 아이 아 어쩐일이다요. 일허다 말고.
- 근게. 어디 아프요? 안색이 안 좋으네.
- 아니에요. 아프긴요.
- 아이고, 얼굴이 희었는데 뭘. 몸살도 날께여. 아 그렇게 밤낮 없이 괭이질을 허는디 그 몸에 무슨 수로 배겨.
- 그 보담도 아주머니?
- 아이구 왜.
- 저, 어디 품삯일 할데 없을까요?
- 품일 하게?
- 네.
- 자네가?
- 삯은 안 받아도 좋아요. 그거 밥이나 먹여주면. 내가 삯일 할 처지나 되나요?
- 아이고 그랴. 누가 자네를 삯 주고 일 시키겄어. 애들만도 일을 못 하는디.
- 아이 저 일이야 하면 느는 것이고, 어서 저저 그쪽 골이나 메 보시오. 밥 걱정은 말고.
- 아 잘 됐네 마침. 안 그려도 일 손 타령하고 있던 참인디 자자, 어서 내려 오드라고.
- 아 네. 그러세요.
- 아이 저 근디 정말 안 아픈겨?
- 아픈 것 보다 배가 고파서. 엇저녁부터 굶었거든요.
- 쯧쯧쯧... 아이 그라믄 진작 내려오지. 어찌 사람이 그렇게 미련스럽제? 보기는 안 그란디.
- 미안해서...
- 아휴... 자네도 어짜면 그리 팔자가 기박헌가. 응? 시상에 혈혈단신 혼자 몸에 따신자리 구경도 못 하고, 그 토굴속에 누워 배까정 곯다니. 아휴.
- 그거 다 생각 잘못 한 탓이지. 아이 그야말로 혼자 몸, 뭘 하면 이보다 못 할까 봐서 사서 고생인감?
- 암만. 사서 고생이고 말고. 눈 뻔히 뜨고 아 뭣땀시 고 야산을 뒤져 뒤지긴. 뭐가 나올거이라고.
- 허지만 나는 밤낮 없이 야산에 매달렸지요. 틈틈이 남의 일 해주고 밥 얻어먹어 가며 죽자고 뒤졌지요. 곡식을 얻자고 땅을 뒤진게 아니었지요. 세상 시름을 잊자고 뒤진거지요. 허지만 땅이란게 그런거인지 밤낮없이 흙을 주무르다가 본께 곡식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마음이 드니께 흙 뒤지는 손이 한결 가벼워 지고 일이 재미가 있더라구요. 게다가 세월 잘 가죠. 그려서 그럭저럭 나는 농사꾼이 돼가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 아고 여기 배잠방이도 좀 받게나.
- 네. 마님.
- 저 배잠방이는 방망이로 두들기면 안 되네.
- 알고 있어요.
- 아이고, 이제 별로 모르는 것도 없제. 헤헤헤. 참 느는게 일이라더니.
- 엄니! 엄니!
- 아니 아니 저저 저 자식이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냐. 아이고.
- 엄니!
- 아이고 왜 그렇게 급혀.
- 어 엄니, 큰 일 나버렸어요 엄니.
- 큰 일 이라니?
- 삘갱이 놈들이 3·8 선을 넘어 왔데요.
- 아이고 난 또 무슨 소리라고.
- 아 이번엔 다르다구요. 서울까지 쳐들어 왔데요. 서울까지.
- 뭐여?
- 아 이번엔 진짜 전쟁이라구요. 엄니.
- 저저 전쟁이라구요?
- 예. 전쟁이래요. 진짜 전쟁.
- 그 그래요?
- 아니 저 자네 왜 그러나. 왜 갑자기 핏기가 싹 가시지?
- 또, 또 전쟁이라니.
그녀는 비틀거렸다. 현기증이 일었다. 잊어가던 악몽이 일시에 돼살아나서 눈 앞에 어른거렸다. 6·25 동난이 터졌다. 다시는 전쟁 같은건 생각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이라니. 헌데.
-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지? 피난민들이 모여들어서 그런가 봐요.
- 아이고 가슴 벌렁거려서. 아이구 저 뭐 살거여. 어서어서 살 거 사가지고 가자구.
- 나야 등잔기름 조금 살건데요 뭐.
- 어. 난 소금 한 되빡 사면 되.
- 그럼, 소금부터 사지요 뭐. 가시죠.
- 아저씨, 소금 한 되빡 두세요.
- 아니, 아니 얜 누군데 여기 앉아서 울고 있어요?
- 아마 부모를 잃었나벼. 아침 나절 부터 여기 이러고 앉아서 울고 있는디 참 딱혀서 못 보것어.
-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가벼요.
- 없어. 어디서 엄닐 잊어버렸는지 모른다누만.
- 가엾어라. 얘, 얘야. 네 이름이 뭐니? 어디서 엄마 잃어 버렸지? 응?
- 저기서.
- 저기 어디.
- 몰라. 가다가 보니까 엄마가 없어.
- 엄마 언제까지 너랑 있었는데?
- 세 밤이나 찾았단 말이야.
- 세 밤이나? 너, 어디서 살았지? 너희 집이 어디야.
- 서울이란 말이야 우리집.
- 아이고 거 서울이 집이라믄 거기다 사흘 씩이나 혼자 헤맸으면 부모 찾기는 어렵것다 어려워.
- 너 그럼 여긴 혼자 왔니?
- 사람들 따라가서 기차 타고 왔어.
- 에이, 틀린거여 그럼.
- 그려. 그려. 틀린겨.
- 그러니 어쩌것어.
- 아들 없으면 아저씨가 데려다 키우쇼.
-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것수만은 아 그 나 자식만 혀도 줄줄이 일곱이요 일곱.
- 아이고매. 그라믄 이 노릇을 어짜제? 부모 찾긴 틀린거고, 아이고 저 이라고 돌아댕기다 굶어 죽기 딱 맞것는디.
- 이 판국에 그 누가 남의 자슥을 맡을라고 허것소. 불쌍하긴 혀도 먹을게 있어야제.
- 아주머니, 얘 내가 데려 갈까요?
- 자네가?
- 예. 내가 데려가겠어요.
- 아이고 자네가 무슨 수로 아그를 거둘라고.
- 우선 먹이고 재우기라도 해 줘야죠. 어떻게 그냥 버리고 가요?
- 아이고 글쎄 집이 있나 밥이 있나. 자네가 무슨 수로 아그를 키워?
- 잠이야 뭐 토굴에서 재우죠. 설마 길바닥 보다야 낫겠죠 뭐.
- 그야 그렇지만. 밥은 있고?
- 내 밥 주면 돼요. 내가 데리고 가겠어요. 여기 두면 안 돼요.
- 인제 배 안 고프지?
- 응.
- 그럼, 아줌마랑 자자. 졸리지?
- 흑흑...
- 왜?
- 나 집에 갈래.
- 집엔 나중에 가고 오늘은 아줌마랑 여기서 자자.
- 엄마 보고싶단 말이야.
- 하지만 지금은 어두워서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자. 아줌마가 업어줄게. 업혀. 응? 자.
아줌마 업고 자자 영일아. 어서, 어서 엎드려. 그리고 자는거야. 착하지 영일이?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아이는 금방 잠이 들었지요. 울어서 지친데다 배가 불러 놓은께 금방 골아 떨어진거죠. 근데 참말로 이상하더군요. 아이를 등에 업고 재우노라니께 등허리가 뜨뜻해 지면서 어째 그렇게 마음이 푸근해 지던지요. 그 때사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혼자 토굴에서 살면서 나가 월매나 외로웠던지 알겠더구만요. 그란디 그 날 밤이 깊어서 였지요.
(입력일 : 2007.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