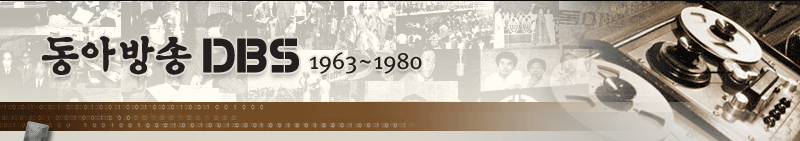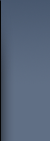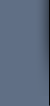|
얘기의 샘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담에는 김하진씨와 이선호씨입니다.
- 그 왜 우리나라 그 수수께끼에요. 하루 천리를 갔다와도 피곤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왜? 선생님 아시겠지요?
- 흠.
- 아, 네. 그러고보니 그 전 시간에 시작했던 신라때 조신에 꿈 얘기는 그 왜 일장 춘몽같은 것이지만 그 꿈에 내용으로 보면은 한 평생에 풍상을 겪는 참 그 무상한 사랑의 인연 얘기인데.
- 아니, 잘 해석하면 우리의 한 평생도 이게 꿈인지.
- 네.
- 모른다는 말이야.
- 네.
- 죽고 그게 꿈인게 망정인지 우리 지금 세상을 사는게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거야.
- 과연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하신 대목은 그렇게 그립고 그립던 그 김흥 공의 딸을 조신이 이제 만나서 같이 한 평생을 지내자고 이렇게 참 조신은 무척 기뻐하며 어쩌할줄 모르는데까지 하셨어요.
- 그때 왜 그 말들은 조신이라. 아마 갑자기 어쩔줄을 모르고서 뭐 그저 아무 대답도 못 하고 멍 하니 앉아있었단 말이야.
- 네.
- 응, 그러나 너무나 뜻밖이지 까닭없이. 뛰다가 울다가 앉았다가 뭐 섰다가 어떻게 할바를 모르고서 뭐 그러니 허둥지둥 그냥.
- 하하, 안절부절.
- 좋아서 안절부절 못하는거지. 그래 한 차례나 지난 다음에 나무아비타불, 응.
- 네.
- 관세음보살. 원래 중이니까.
- 네.
- 인연 맺어주는걸 되새지보살.
- 하하, 네.
- 기쁜 한숨을 내쉬고서 그저 얼굴 무슨 결에 어느 틈에 손이 가는줄 모르게 해서 손을 꽉 잡았단 말이야.
- 색시 이름이 김랑이지요?
- 김랑이지.
- 쥐고서 그래 그리고 어느 틈이던지 뒤로가서 실컷 껴 안았지.
- 하하, 네. 저런 중조한 것이.
- 응, 조신이라는게 이것을 들어서 소원성취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소원이 제대로 되고 보니까 농막이고 무슨 농사 농막지기고 마름이고 농사짓는거 이까지거 다 내 버려라.
- 파계승이 됐군요.
- 응, 다 내 버려라. 그러고서 그까지거 다 버리고 그래 우리 거기가서 다른 데로 가서 내버려두고 살자고. 농막을 살다가는 누구한테 들켜가지고 무슨 일이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 그렇지요.
- 그래서 즉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살게 되겠다는 말이야. 그러니 하루도 지나고 이틀도 지나고 차차 살아가는데 그 기쁜 마음을 어떻게 참을수가 없어서 한해 살고 두해 사는 동안에 그 애정에 열매가 생겨서 차차차차 아기도 낳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럭저럭 한해 두해 십년 안쪽에 애 다섯을 낳았더라.
- 아이도 많이 낳았네요. 뭐 지금같이 가족끼리의 뭐 정신이 있는건 아니겠습니까.
- 응.
- 네.
- 그러나 그들이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럭저럭 한 40년을 지냈어.
- 네.
- 꿈에도 무슨 횟수로는 알던지.
- 네.
- 40년을 지낸 세월이, 그러나 살림은 지독하게 가난하단 말이야. 가난에 살수가 없어.
- 네.
- 아 그래 그때에는 몸을 말이야, 어떡하던지 살아나갈텐데 몸 어디로 가서 나가서 살려고 할수가 없어서, 그나마 그 조그마한 오막살이를 다 없애버리고서는 팔아먹었는지. 없애버리고서 움막을 짓고 살았던 말이야. 그러나 사방에 벽도 없고, 헌 누더기조차 얻을 수도 없고.
- 네.
- 거적조차 얻을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나 내 몸을 다 어떻게 가리고 살 도리가 없고 너무도 어떡할 수가 없고, 그래 풀, 산에서 들 나무로 나가지고 나는 풀 무슨 곰취.
- 헤헤, 네.
- 무슨 도라지.
- 네.
- 이런거나 캐 먹으면서 지내야할거 같다는 말이야. 아, 그래 이들은 일곱식구 모두다 어떡할 도리가 없지.
- 네.
- 그래 할수없다, 이제 거리로 나서서 이제 빌어먹을수 밖에 없다. 그러고 빌어먹기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 네.
- 하기로 했는데 뭐 암만 빌어먹지 않고, 그냥 집으로 해서 지낼려고 해도 살수도 없고 그러나 하다못해 깡이 꿈이라도 뉘집가서 팔 한품이라도 팔고 일이라도 할 때가 없었는지.
- 하하, 네.
- 꿈이니까 어떻게 살수가 없고 없으면은 뭐 목숨이나 어떻게 부지 해볼려고 그래 그래서는 이래저래 지내다 보니까 참 죽겠다는 말이야. 그동안에 그들은 둘이 창자를 다 메고서 넋놓고 채워볼 도리가 없으니까. 홀가분이 빌어먹으러 나섰던거야.
- 거리의 행각을 나섰군요?
- 빌어먹으러 나섰는데 그러니 빌어먹으려해도 식구나 단조로워야지. 일곱식구이지, 거기에다가도 조그마한 어린애까지 있을거야.
- 네. 그거를 부등켜 안고.
- 부등켜 안고 데리고서 강릉으로 오다가 귀네미로 하는데로다가 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 자꾸 이제 이리저리 가는데 그러나 고개 넘어가는데 해는 아들 하나 있다가 아이고 엄마 나 이제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 나 이제 어떻게 할수가 없어. 그러고 헉헉 하더니 배가 부었지 그래가지고.
- 쯧쯧쯧.
- 딱 그래서 죽는다. 죽은 아이를.
- 들쳐 없고.
- 하나를 가운데에 놓고 그래 이제 여섯식구가 되었지.
- 네.
- 여섯식구가 암만 울어대니 뭐 소용이 있나. 그러나 남은 네 아이하고 두 식구하고 어떻게 살아서 자 이제는 할수없다. 죽은 아이는 할수 없거니와 남은 네 아이나 살려보자.
- 그러고서 통곡을 하고서 손으로다가 산 골짜기에다가 허비정을 하고서 그 아이를 묻었다는 말이야.
- 네. 그거 또 엄동설한 아니에요?
- 모르지.
- 네.
- 엄동설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 네.
- 아 그래 그래서 묻어버리고 통곡을 하다가 해는 저물어가고 바람은 점점 지나 아마 추울때가 되었는지, 여름이라도 춥지. 그 지경이면. 가서 하나둘을 울지마 하고서 있을수는 없잖아 해 가지고 가서 딱 결심을 해가지고 여섯 사람이 또한 일제히 일어서서, 불쌍한 넋들을 그저 아무쪼록에 네가 불쌍하게 되어서 죽었고, 이렇게 되었으니 아무쪼록에 그저 극락세계에나 가달라고 죽 쓸뿐이지, 소용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넘어왔다는 말이야. 그러니 어린 것들은 또 우는데.
- 그렇지요 뭐.
- 배고프다고 울고 왠지 울음을 달래면서 또 한손으로는 우는 아이들에 아내 서러움을 슬퍼함을 외로워하면서 어찌하오, 이리된 것을 어떻게하오. 네가 도무지 다 내가 마음을 잘못먹어서 이런거라고. 당신도 왜 이렇게 날 찾아왔소. 그래 살면서 물러나와서 고개를 넘어서 저쪽 어느 마을이던지 찾아갔다는 말이야.
- 네.
- 찾아갔는데 산길가에 그 왜 다 들판뒤에서 원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 배는 고픈데 갈길도 갈길조차 집도 없다는 말이야.
- 아무리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 응.
- 역시 사랑이라는게 좀 어느정도.
- 응.
- 기본적인거는 가져야.
- 응.
- 사랑도 유지하겠군요.
- 응.
- 그 이제 불쌍한데도 아이 죽은거를 한번 돌아다보고서 지팡이 막대를 짚고서 이제 그저 간단 말이야.
- 네.
- 그래 인즉 떨어진 치맛자락에 눈물이 떨어지고 가는 어머니에 가는 에미가 자꾸 슬퍼 돌아다 보아지면서 갔다는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도 돌아다보고 그러고 아이들이 모르고 여섯이 갈 적에 언니 언니 언니 잘 들어 누웠소. 아무쪼록에 극락세계에 가시오. 아 요것들이 조잘거리니까 제 아버지, 제 어머니의 눈에서는 더 눈물이 나오더라고 말이야.
- 네.
- 그래가지고 이 어린 것들은 끌어들여가지고 조심조심 내려갔지.
- 네.
- 내려가는데 이게 조신과 그 아내는 남은 네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밤에 산 고개를 넘어서 넘기는 하였으나 밤은 깊고 산길은 알수 없고.
- 배는 고프고.
- 배는 고프고 김새는 우르렁 거리고.
- 네.
- 바람은 불고 오로지 대지가 지나서 지나가는 비는 뚝뚝 떨어지고.
- 하, 참 설상가상격이로군요? 응, 그러니 그래가지고는 낮에 업고서는 마을을 어느 마을을 찾아가서 그러고보니, 어디를 가니 어떤 뭐 어디가서 자리 하나 얻어볼 수가 있나, 따뜻한 방이 있을것이 있나.
- 그 뭐, 인가도 안 보이던가요?
- 인가도 없어서 인즉 그렇게 생각하고 산 중턱에 풀밭에 길에 앉아서 그 여섯식구가 피곤한 몸을 쉬고 모진 것을 잠을 자느라 잠이 사르르 들었다는 말이야.
- 지쳐서 그만.
- 응, 서로 껴안고 코를 골으니 그때에 배가 뭐 가엾고 그들의 이 날에 하루가 어느덧 십년보다도 더했다.
- 네.
- 그래, 조신의 식구들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산밑 마을로 내려와서 뭐 그저 몇술 그러니 여러 식구가 먹으니 한 그릇 가지고 며칠씩을 나눠 먹지 않아.
- 네.
- 얻어먹고서 내려왔으나 가엾으나 어떻게 돌아다닐수도 없고 발길이 돌아서지를 않는다.
- 네.
- 아, 그래 인즉 그럭저럭 우국현이, 우국현이 지금 어디있는지는 모르지만 우국현이라는데를 들어올 때에는 산과 들에 흰 눈이.
- 네.
- 쌓이고.
- 역시 겨울이로군요?
- 응.
- 엄동설한에.
- 귀로에 얼음조각이.
- 네.
- 번들번들해서.
- 네, 조신에 평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 응. 아직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할수가 없더라 그런거였더라.
- 오늘 거기까지.
- 응.
(음악)
지금까지 대담에는 김하진씨와 이선호씨였습니다. 얘기의 샘 시간을 마칩니다.
(입력일 : 2009.10.01)
|